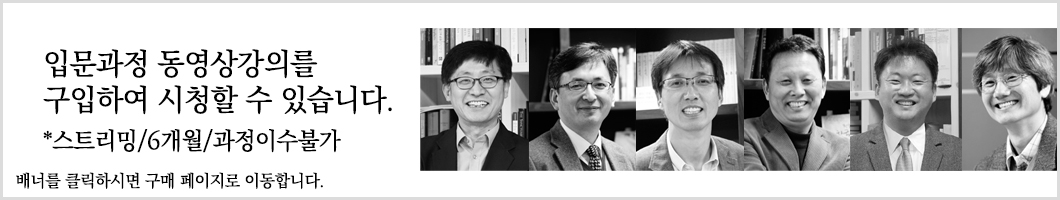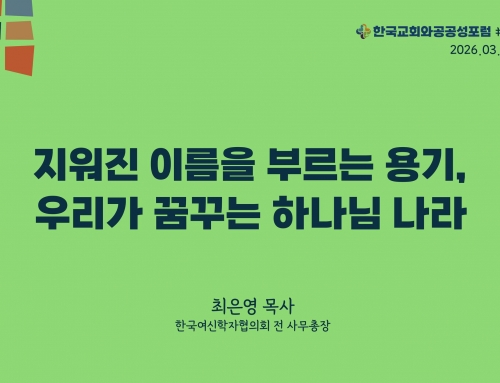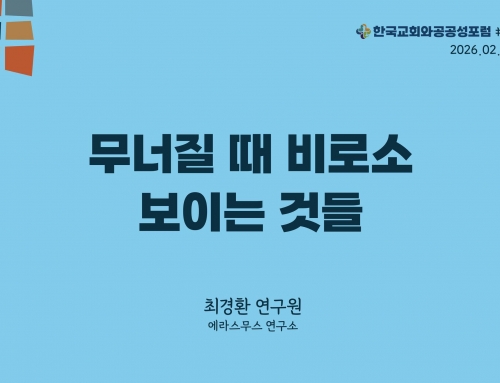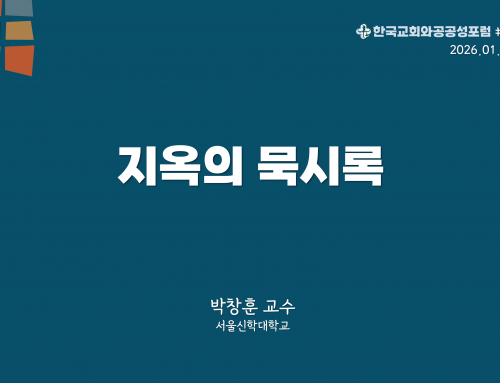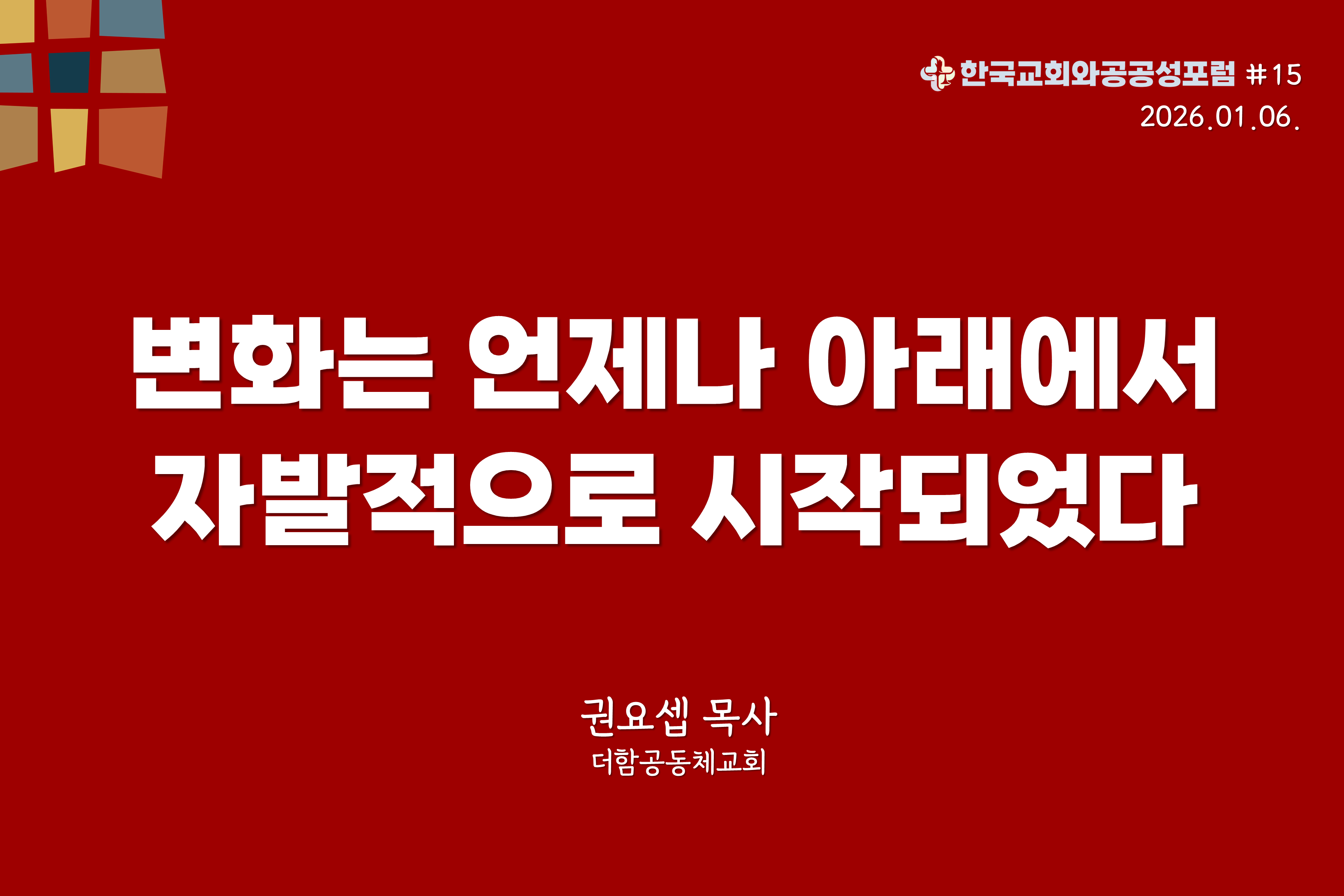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 칼럼 #15 (2026.01.06)
변화는 언제나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
권요셉(더함공동체교회 담임목사)
타락은 자발적이다
대부분의 혁명은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갑자기 한 사람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혁명들도 내부로 들어가보면 이미 움직이고 있던 미시적인 전파의 힘에 의해 흘러간 것에 가까웠다. 한 사람에서 한 사람으로 혁명의 가치가 전해지며 아주 조금씩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변화는 이렇게 언제나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혁명이나 타락이나 매 마찬가지다. 타락을 누군가 외부에서 강제하지는 않는다. 타락은 언제나 자발적이다. 교회의 타락의 원인을 목회자들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교회의 타락은 성도들의 자발적 결과였다. 수많은 교인들이 타락한 목회자들을 원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타락은 자발적으로 발생해서 강한 전염성을 갖는다.
교회가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 지 오래다.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성장해야 할 조직이 되었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기관이 되었으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할 브랜드가 되었다. 목회자는 영적 안내자가 아니라 성과를 내야 하는 관리자처럼 평가되고, 성도는 신앙의 동역자라기보다 유지해야 할 구성원, 혹은 잠재적 이탈자로 취급된다. 교회의 건물과 자산, 그리고 담임 목사의 연봉이 교회의 자랑이 되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일부 교회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성도들이 이런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 “우리 교회는 커.” “우리 교회는 영향력이 있어.” 이런 말들이 신앙의 고백처럼 오간다. 교회는 점점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공한 삶의 증거물이 된다. 당장 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가 크고 화려하면 뿌듯하고 작고 허름하면 부끄럽다. 왜 이런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마주해야 한다. 이런 교회는 몇몇 목회자를 바꾼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특정 인물이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 내면화한 욕망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교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안정과 성공의 확신을 얻고 싶어한다. 불확실한 사회에서, 크고 강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감각은 큰 위안이 된다. 교회가 자본주의적 질서를 비판하기는커녕 그 질서를 신앙적으로 포장해 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쉽게 비판받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재생산한다.
제도적 개혁의 한계
교회 개혁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20 여년 전에 변화를 준 것들은 대체로 투명한 재정, 공정한 목회자 사례비 기준, 세습 금지, 외부 감사와 같은 장치들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교회의 건강성이 회복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제도는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욕망 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여전히 큰 교회를 선호하고, 강력한 목회자를 원하며, 성공한 교회에 속해 있다는 자부심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적 변화도 결국 형식만 남게 된다. 제도는 쉽게 우회되고, 새로운 명분으로 다시 무력화된다. 뜨겁게 가나안 성도를 생산하던 흐름은 꺽였다. 민주적 운영이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한국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면 모두 알고 있다. 민주적 운영을 통해 건강한 시스템과 제도를 바꾼 결과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는가? 틀리지 않았더라도 제도의 변화는 흐름을 만들지 못했다. 변화의 힘은 제도에서 나오지 않는다.
한국교회의 건강성은 어느 날 갑자기 위로부터 선언되어 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결코 회복되지 않는다. 변화는 미시적이고 자발적인 성도들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초기 민주적 운영 교회들은 더 크고 안정적인 교회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결정, 불편하더라도 투명한 공동체를 택하겠다는 용기, 서로의 삶을 돌보는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태도를 가치에 담아서 규약으로 만들었다. 모두 아름다운 결정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상징성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최소한 아직은 그렇다. 작고 화려하지 않아도 타락할 수 있고, 투명한 공동체에서도 분쟁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서로의 삶을 돌보는 관계에서도 폭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제 잘 알고 있다. 이제 솔직해져야 한다. 좋은 방향이어도 제도가 무엇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제도는 최소한의 방어막이지 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수는 아니다.
변화는 자발적으로 전염성을 갖는다.
타락이 눈에 띄지 않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혁명도 그 시작은 눈에 띄지 않는다. 숫자로 측정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실패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아지고, 흩어지고,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크다. 혁명이 눈에 띄는 이유는 드러날 때에만 보기 때문이다.
거룩한 변화는 타락의 방식과 유사하게 일어난다. 누군가 변화를 갈망하고 그 변화를 행동하고 그 행동이 전염된다.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다. 한명에서 한명으로 변화를 전염시킬 각오가 있어야 가능할 일이다. 긴 시간이 걸릴 일이다. 그래서 최종 목표를 세우는 것은 오히려 힘든 일이다. 최종 목표를 세워서 큰 흐름을 바꾸기 위해 큰 장치들을 만드는 것보다 작더라도 바른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의 성도가 세워지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 변화의 정석이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고, 종교개혁자들이 한 방법이다. 개혁의 역사들에서 늘 존재했던 방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과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방향이 당장은 어떤 개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변화의 정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100년 후 한국 교회의 판도를 바꿀 개혁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물론, 다른 길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에 다른 쉬운 길이 생긴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감사할 일이고,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뚝심있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이 일이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