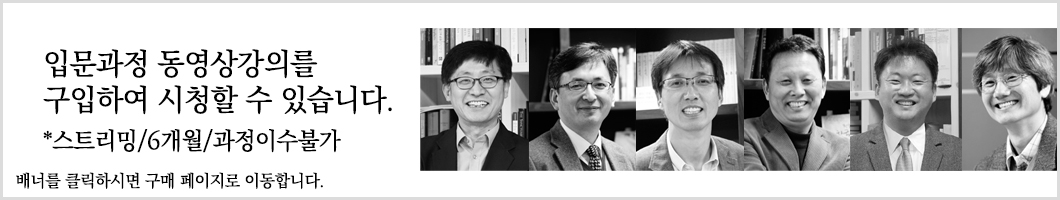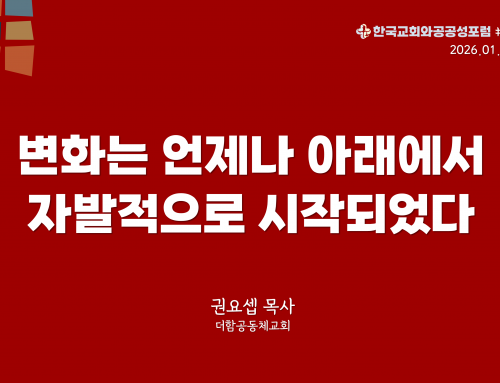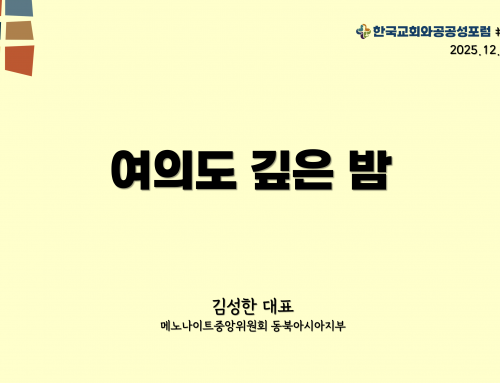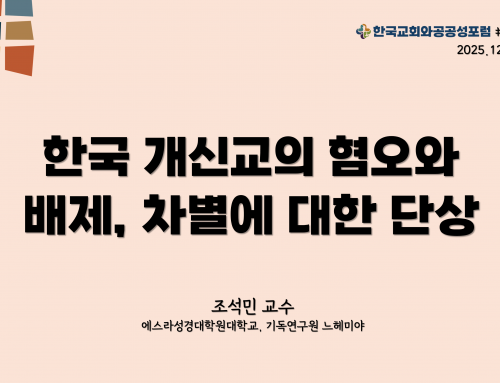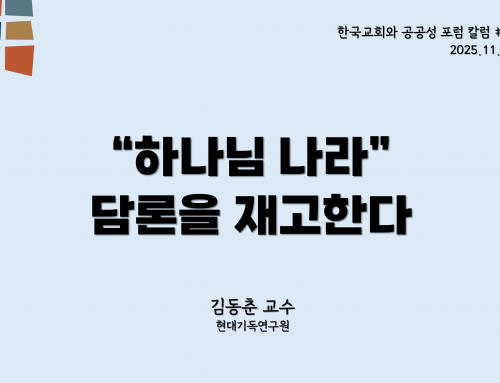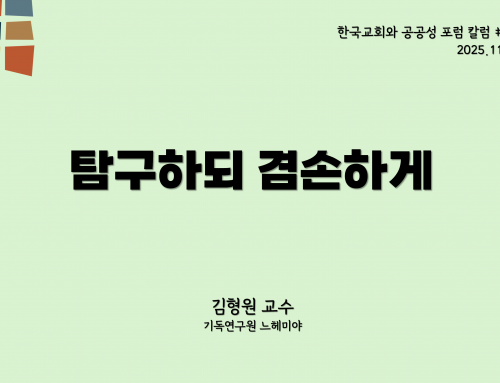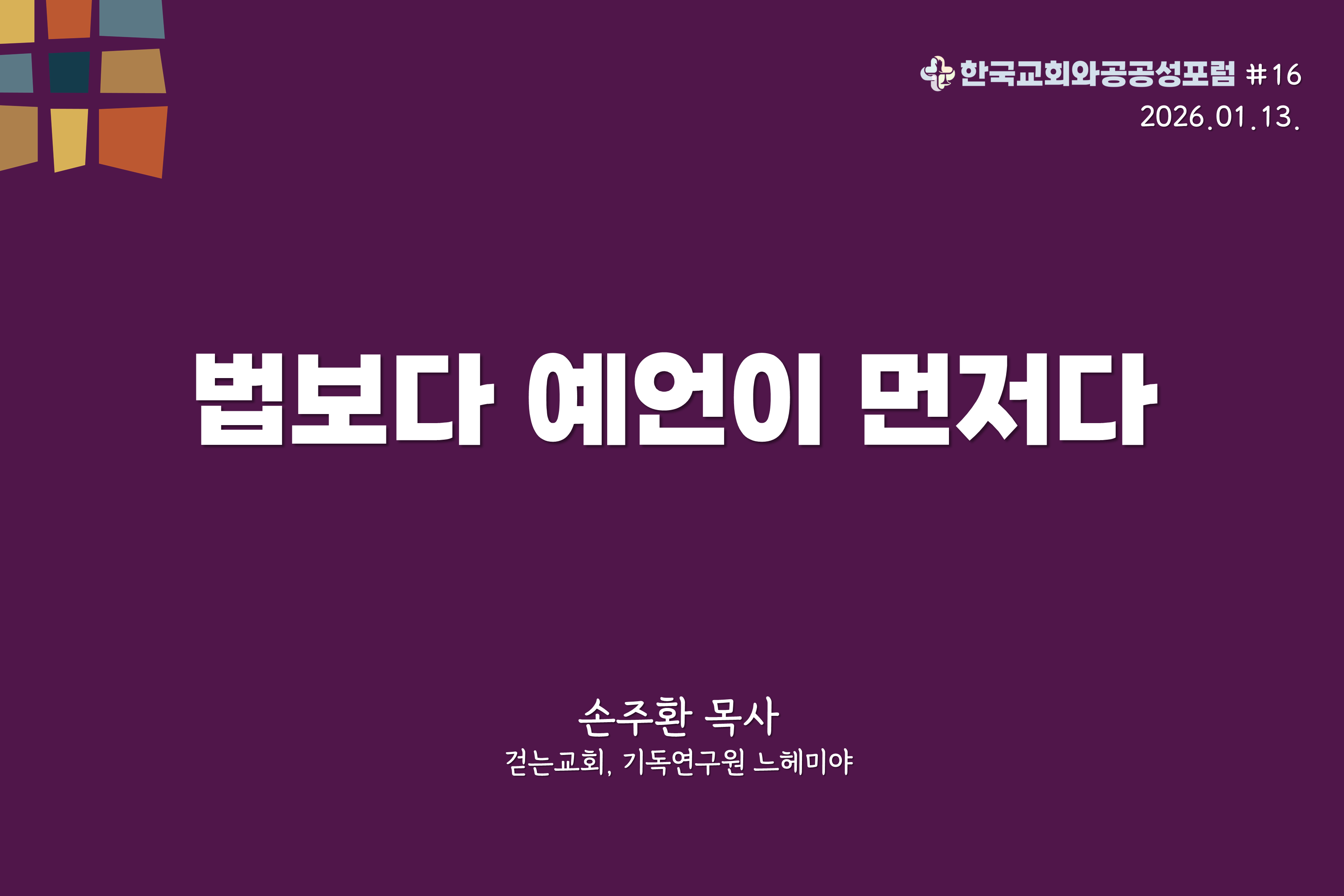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 칼럼 #16 (2026.01.13)
법보다 예언이 먼저다
손주환 목사(걷는교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는 ‘법’이다. 정치적 갈등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고소와 고발로 귀결되고, 공동체의 윤리적 시비는 법원의 판결문 앞에서야 비로소 입을 다문다. 법원의 최고 권력자는 대법원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사회적 여러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는다. “법대로 하자”는 말은 더 이상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대화의 시작을 차단하는 무기가 되었다. 바야흐로 ‘사법 만능주의’의 시대다. 법적 판단이 곧 도덕적 면죄부가 되고, 판결이 진리의 최종 권위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법이 모든 정의의 선행 조건인가?
오래전 성서학계에 던져진 흥미로운 명제 중에 “Lex post prophetas(예언자 이후에 율법)”라는 주장이 있다. 19세기 율리우스 벨하우젠을 위시한 비평학자들이 구약성서의 율법이 예언서보다 연대기적으로 나중에 위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겨난 명제이다. 학문적으로는 복잡한 문서 가설 논쟁이지만, 이를 신학적·사회적 함의로 확장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명제는 본질적으로 순서,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다. 무엇이 먼저인가? 성서의 역사를 보면, 딱딱한 조문과 규정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의 외침이 있었다. 고아와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호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뜨거운 절규가 먼저 있었고, 그 정신을 구체적인 삶의 체계로 담아내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다. 즉, 법은 예언자적 상상력과 가치를 보존하고 실현하기 위한 그릇이지,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성서에서 율법은 공동체의 죄와 억압, 폭력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회개촉구와 미래 선포라는 예언자적 목소리를 따라 형성된 것이라는 말이다.
현대 사회는 이 순서를 뒤집었다. 예언자적 고뇌와 윤리적 상상력은 사라지고, 법조문의 해석만이 난무한다. 법이 예언을 앞서게 되면서 정의는 올바름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로 전락한다. 법 기술자들은 법망을 피하는 법을 고안해 내고, 명백한 불의 앞에서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뻔뻔한 말로 방패를 삼는다. 법은 때때로 권력을 정당화하고, 약자를 침묵시키는 수단으로 작동해왔다.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예언자적 눈물이 메마른 곳에서, 법은 강자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강철방패가 되어 버릴 뿐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언이 먼저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생각하게 한다.
성서의 예언자들은 율법 조항을 따지기보다 시대의 아픔을 직시했다. 예수께서도 이 전통에 서 있으셨다. 예언자들은 말한다.
“너희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되,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버렸다.”(미 6:8, 마 23:23)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서의 회복이다. 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사법의 독립성’이라는 말이 정의의 최소한의 장치로 중요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곧 정의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렇기에 법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보다 앞선 가치, 즉 예언자가 선포한 정의와 자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기억하자는 것이다. 법은 예언자의 뒤를 따라야 한다. 예언자적 목소리가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인가”라고 탄식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꿀 때, 법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뒤따라와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갈 때,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법의 영역이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이윤보다 가벼울 수 있는가”라고 묻는 것은 예언의 영역이다. 예언의 질문이 먼저 터져 나올 때, 비로소 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제도로 응답하며 진보한다.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지하철에서 외칠 때, “시위법 위반인가”를 묻는 것은 법의 시선이다. 그러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를 상상하는 것은 예언의 시선이다.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혐오로 신음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하다”고 연대하는 것이 예언의 시선이다. 그리고 그 시선을 이어받아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로 응답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러한 예언자적 상상력이 앞설 때, 법은 차별을 철폐하는 도구로 거듭날 수 있다.
“Lex post prophetas.” 법은 예언 뒤에 온다. 이 명제는 오늘날 사법 만능주의에 빠진 우리 사회를 향한 준엄한 경고이자 죽비가 될 수 있다. 법이 예언자의 뜨거운 가슴을 상실하는 순간,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세상이 법리 논쟁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 합법과 불법의 기계적 경계를 넘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가를 치열하게 물어야 한다. 법이 담아내지 못하는 사각지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을 감지하는 예민한 영성,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