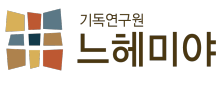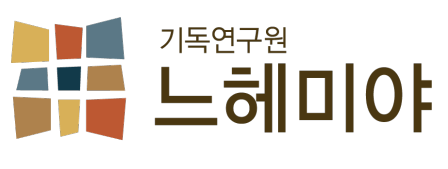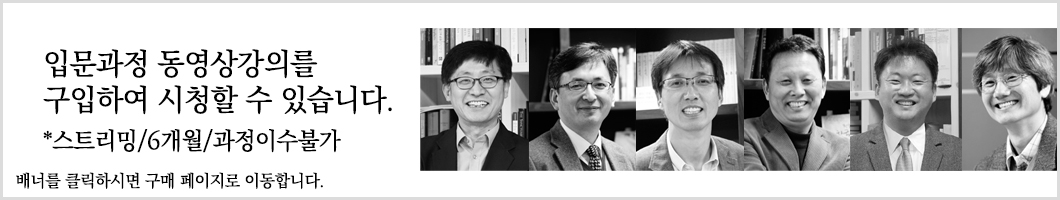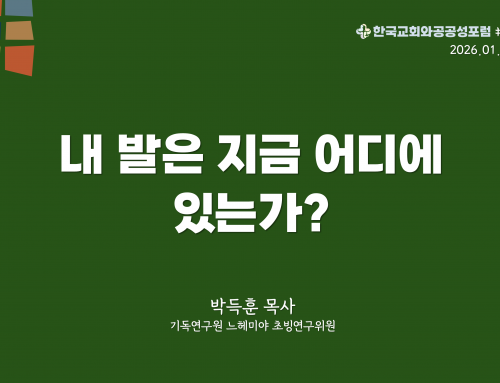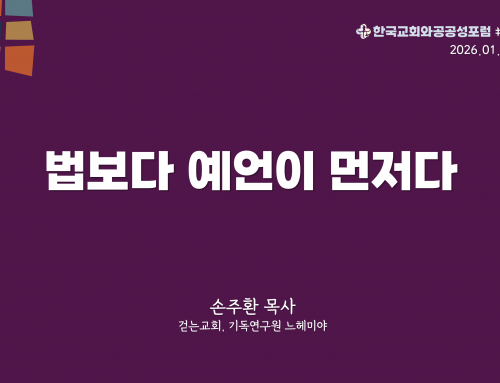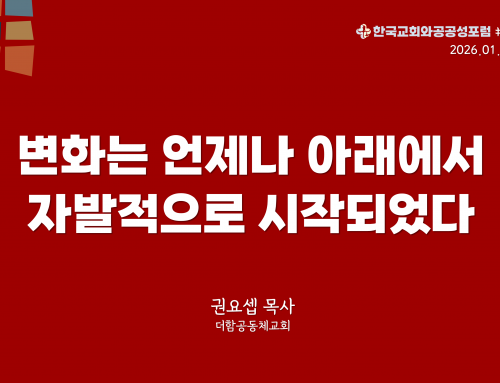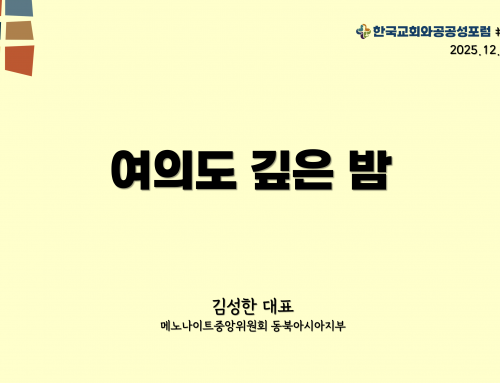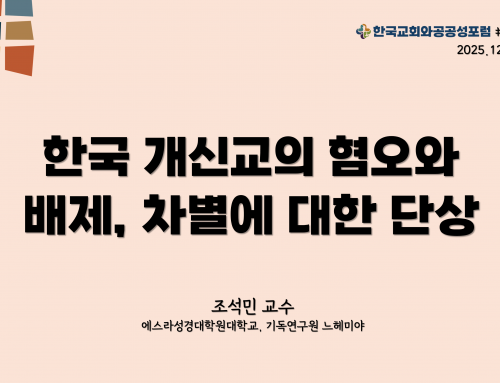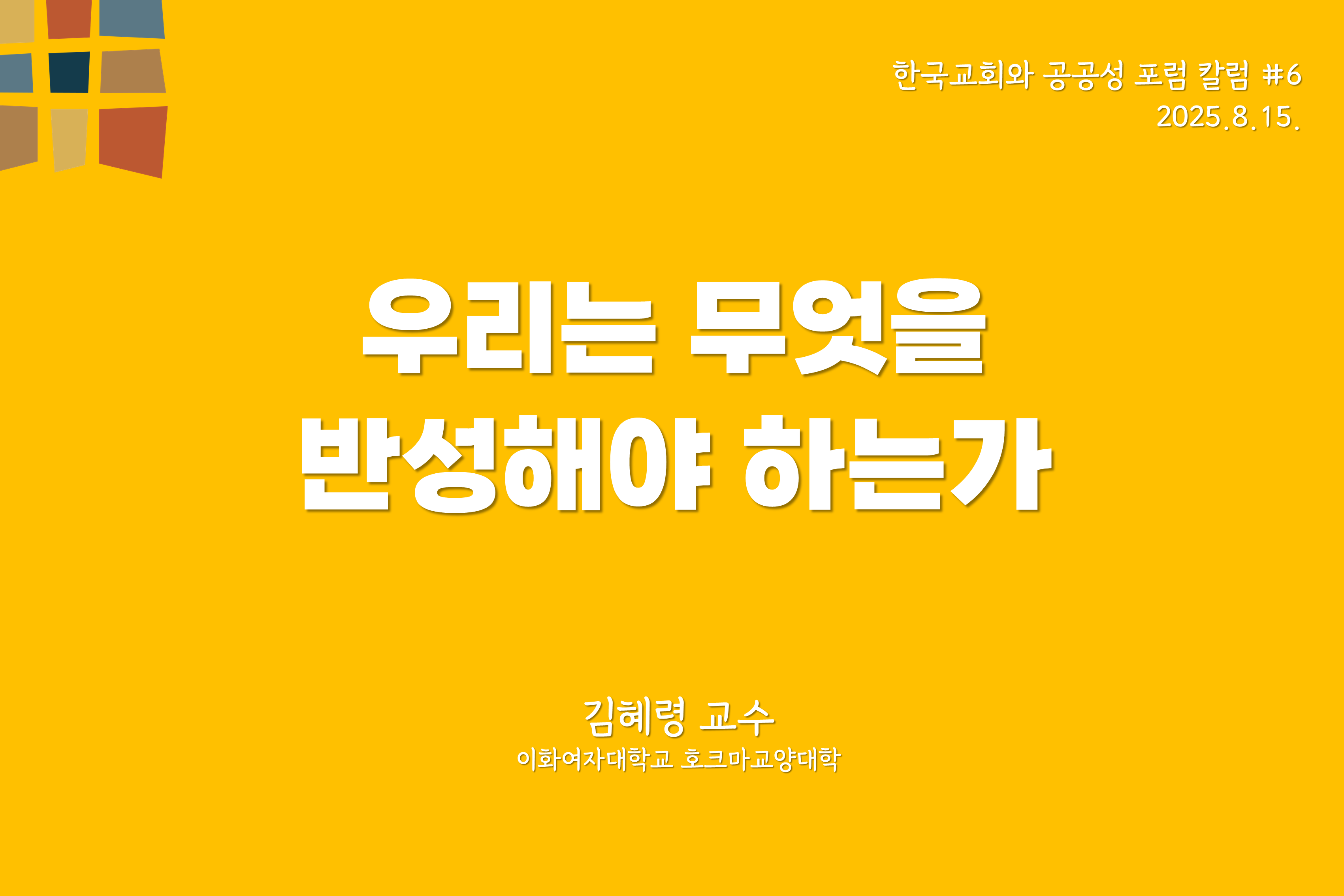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 칼럼 #6 (2025. 8. 15)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가
김혜령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 윤리신학자)
12·3 계엄 사태 이후 30 여명의 신학자들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반성하며 초교파적인 연대와 협력의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무슨 일을 위해서든 모임의 이름은 곧 그 모임이 하려는 일을 담고 있는데, 이 모임의 첫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꿈꾸는 신학자들의 모임’이었다. 이후 보다 현대성과 형식미를 갖춘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이라는 공식 이름을 갖게 되었지만, 첫 이름에 이미 우리가 모인 목적이 너무나 명쾌하게 담겨 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개신교인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종말론적 신앙을 통속적인 내세적 신앙으로 축소하여 믿는 이들이 많은 이 땅에서는 누가나 마가, 요한 복음의 용어인 ‘하나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라는 말보다 마태복음의 ‘하늘 나라’(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라는 말이 설교와 성경공부 시간에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현’이라는 말도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하늘 나라’, 즉 ‘천국’을 이해하는 이들이 다수인 곳에서는 – 마태도 뒷목을 잡을 일이다 – 그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된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예수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영생만 있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 정도밖에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현’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 그 나라의 도래 시점이 결정되는 것인데, 인간이 도대체 뭐라고 그 나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솔직히 인정할 때 ‘한국 교회와 공공성 포럼’에 참여하기로 한 신학자들이 반성해야 할 것은 단순히 개신교 교회의 도덕적 부패나 교회 지도자들의 극우화에 멈출 수 없다. 개신교 신학자로서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할 일은 도대체 이 땅의 개신교인들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신학을 제공해 왔는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국 개신교의 도덕적 부패나 극우화는 일부 사람들의 일탈 문제라기 보다, 교회가 이제까지 가르쳐 온 신학의 빈곤이나 왜곡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2 천년 신학의 오래된 역사가 증거하는 그 풍부하고 거룩한 구원의 언어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나 ‘구원의 5영리’와 같이 극단의 납작한 언어로 짓눌러질 때, 또한 창조신앙의 무궁한 깊이가 ‘창조과학’이나 ‘지적 설계론’과 같은 사이비 지식에 매몰될 때, 그리고 약한 자를 우선적으로 보듬는 하나님의 ‘정의’가 경쟁과 독점, 차별을 원리로 삼은 지배 질서에 의해 적대시 될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읽고 배우며 말해 온 것들을 그저 신학교 강단에, 우리가 쓴 글에 꽁꽁 가둬둔 것이다. 그러니 솔직히 고백하건대, “교회라는 현실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 신학자들의 변명에는 패배주의와 엘리트주의, 이 양 극단이 혼재되어 있다.
이 모임을 통해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되기만을 노력하지 말자. 불의한 정치의 폭거에 맞서 저항하는 데에만 힘을 다 쏟지 말자. 그 일은 기독교인 모두, 아니 시민 모두에게 의무 지어진 일이다. 신학자인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구현에 대해 말해 온 신학을 제대로 확산해 보자. 새롭게 뭘 더 하자는 말이 아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잘 배우고 성찰해 온 것들을 소리내어 펼쳐보고 확산해 보자. 우리의 풍부하고 거룩한 말들로 납작하고 거짓되며 포악한 말들을 밀어내자. 혼자는 버겁고 두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기로 ‘우리’가 여기 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