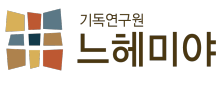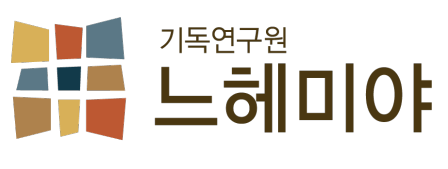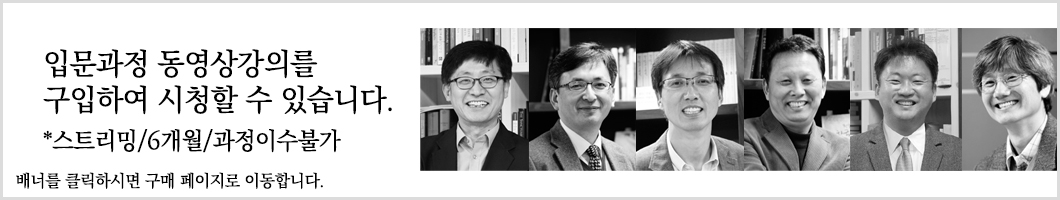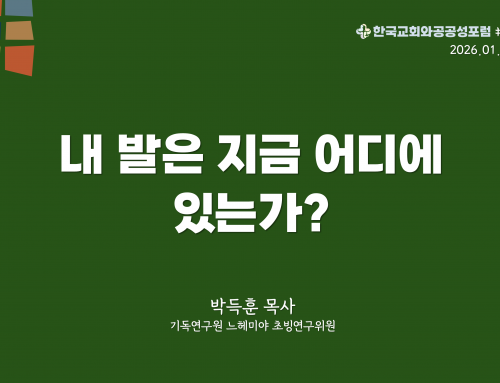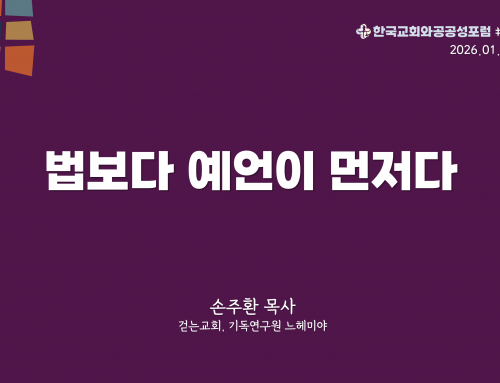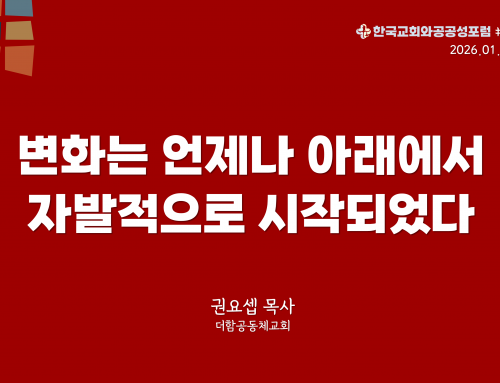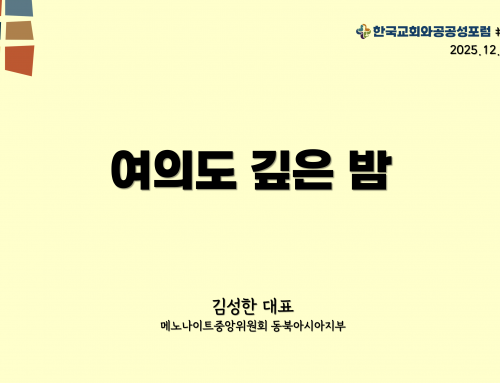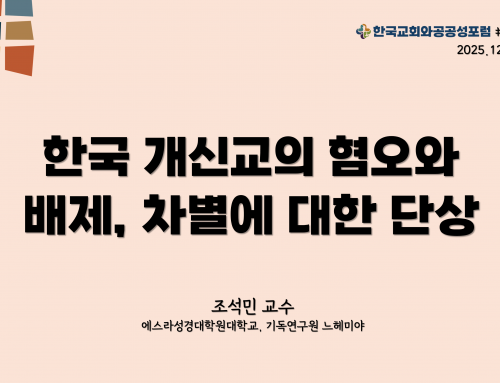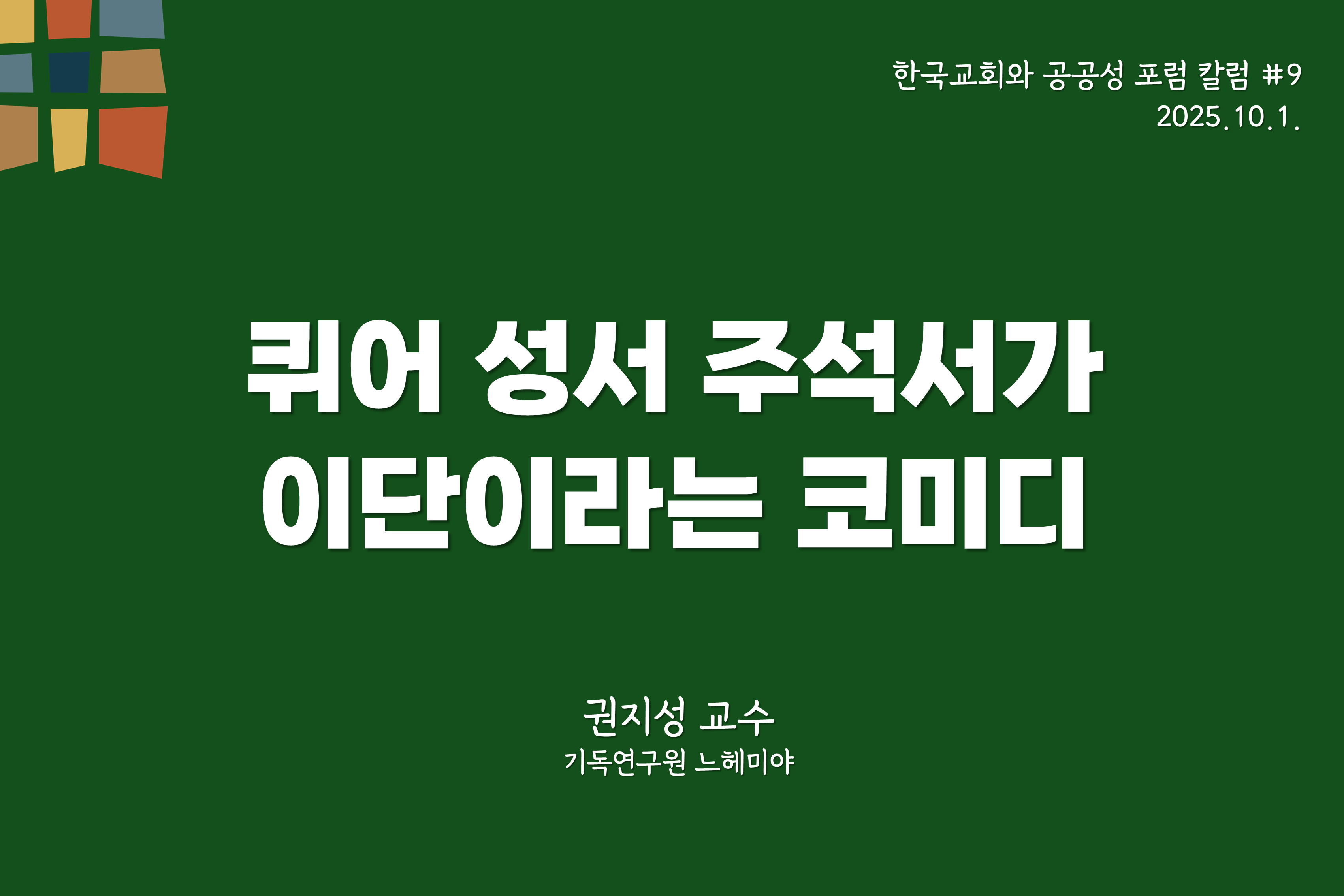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 칼럼 #9 (2025.10.1)
퀴어 성서 주석서가 이단이라는 코미디
권지성 교수
해석학(Hermeneutics)은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해석 과정 속에 ‘나’라는 주체가 개입하는 것이 본질이다. 철학의 사조 속에서 해석학은 성서해석학과 함께 시작했고 발전해 왔으며, 그 핵심은 교회가 제시하는 절대적·불변의 해석에 종속되지 않고, 개개인의 삶과 이야기가 성서 속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슐라이어마허, 딜타이, 하이데거, 리쾨르의 해석학적 기초에 기반하여 성서는 수많은 문화와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읽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예컨대 해방신학적 관점과 포스트콜로니얼 해석은 서구 중심의 성서를 비서구적 맥락에서 새롭게 읽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제 한국적 사상과 문화의 뿌리 속에서 성서를 주체적으로 읽어낼 기반이 마련되었다. 생태학적 읽기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과 제자도의 삶을 어떻게 결합해 해석할지를 질문한다. 더불어 여성신학적 읽기, 독자중심적 읽기, 구조주의적 읽기, 해체주의적 읽기 등 다양한 방법론이 등장하면서 해석의 지평은 무한대로 확장되었다. 때로 이 다원성은 긴장과 문제를 낳기도 하지만, 가톨릭 신학이든 개신교 복음주의 신학이든 이를 수용·변형·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한국 보수 복음주의 교회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여전히 해석의 권력을 일부 권력자들이 독점하면서, 신학교와 교회 모두 해석학적 생기를 잃은 지 오래다. 한국 보수 개신교 체제하에서 교수와 목회자는 자기검열에 익숙해졌고, 역사비평과 해석학적 다양성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극우적·반공주의적 신앙과 성서 이해다. 교회는 파괴적인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비판하면서, 약자들과 이웃들을 섬겨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온갖 종류의 혐오를 조장하며 사회적 소수자들을 억압하기에 바쁜데, 이때 휘두르는 것이 성서 해석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그렇다. 이들은 언제나 성서를 “빨갱이 종북 좌파”를 공격하는, 힘없는 소수자들을 겨냥하는 무기로 활용한다. 대한민국 상식적인 시민들이 겪었던 12.3 내란 사태의 원흉, 윤석열 정권의 내란을 지지하는 전광훈, 손현보 목사와 제대로 결별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 보수주의 교회들이며, 당신들이 속한 보수 교단들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한결같이 이슬람 혐오와 동성애 혐오를 반복적으로 확산시켜 왔다.
그 극단적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퀴어 성서주석』 이단 규정이다. 2025년 9월 25일 예장통합 제110회 총회 셋째 날 회의에서, 제108회기 헌의위원회가 이첩한 “퀴어 성서주석 I, II” 연구 안건이 논의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총대 980명 중 775명이 찬성하고 15명이 반대하여 해당 주석서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안이 가결되었다고 한다(엄태빈 기자, 뉴스앤죠이, “예장통합 <퀴어 성서 주석>·통일교 이단 규정…전광훈 이단 지정은 1년 연구”, 2025년 9월 25일). 총회는 이 책들이 성서 해석의 보편성을 고의적으로 배척하고 퀴어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본문을 왜곡했으며, 성경론·그리스도론·창조론 해석에 심각한 이단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회의에서 통일교 역시 재차 이단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 관련 사안은 1년 연구 과제로 이첩되었다.
“퀴어 성서주석” (초판 2006, 개정판 2015)은 서구권에서 전통적인 주석 방식을 넘어 젠더와 성적 지향을 본문 해석의 중심에 둔 퀴어 성서 해석을 본격적으로 펼쳐낸 저작으로 높이 평가받아 왔다. 서구 학계에서 제럴드 웨스트, 켄 스톤, 마르셀라 알트하우스-리드 등 권위 있는 학자들은 이 책을 퀴어 해석학의 “표준 참조서”이자 “성소수자 공동체의 신학적 해석을 학문적으로 정당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교회와 신앙 공동체 담론 속에서도 널리 읽히고 있다. 그런 귀한 학문적 성과를 당신들이 어떤 권한으로 이단이라고 규정하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예장통합의 “퀴어 성서주석” 이단 결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째, 성서 해석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제약하면서도 목회자 세습 문제와 전광훈 관련 사안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이중 잣대를 보였다는 점이다. 학문에는 철칙을 들이대지만, 전광훈이라는 권력에는 관대하다. 이 결정이야말로 코미디 아닌가? 둘째, 21세기 대명천지에 학문·인권 환경과 어긋난 시대착오적 결정으로 국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윤리 기준(인권, 차별금지, 학문·표현의 자유)에도 미달하는 구태의연한 교리주의로 최소한의 개인 인권 감수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이다. 셋째, 980명 중 15명만이 반대표를 던졌으니, 1.5%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압도적인 다수가 퀴어 주석서를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애기다. 기가찬다. 나는 실제 통합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이 퀴어 문제에 대해서 교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통합 내부의 의식있는 목회자·신학자들이 이것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하는 풍토가 자기모순적이며 우스꽝스럽다. 결국 이는 “당신들은 왜 신학을 공부하는가—진리를 사랑하기 위해서인가, 안전한 커리어를 위해서인가?”라는 뼈아픈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사실 『퀴어 성서주석』은 1990년대 켄 스톤(Ken Stone), 로버트 고스(Robert Goss) 등이 주도한 『퀴어 주석과 성서』(Queer Commentary and the Bible, 1998)와 같은 모음집의 흐름 위에서 등장하였다. 이어 2000년대 중반에는 에스시엠 (SCM Press)에서 전 성서를 포괄한 『퀴어 성서주석』(The Queer Bible Commentary, 2006)이 출간되었고, 동시에 셰필드 (Sheffield Phoenix)가 『퀴어링』(Queering) 시리즈를 통해 개별 성서별 퀴어 주석 작업을 선보이며 제2세대를 형성하였다. 최근에는 2022년 개정·확장판 『퀴어 성서주석』과 에스시엠의 『성서와 성 시리즈』(The Bible and Sexuality Series) 등이 출간되며, 트랜스·논바이너리 정체성, 교차성, 탈식민주의적 시각을 포괄하는 제3세대의 확장기로 접어들었다. SBL 연례 성서학회에서 지속적으로 퀴어 성서 해석학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그 누구라도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을 의심하진 않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모든 비평학에 장점과 단점이 있듯 퀴어 해석학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모든 해석에는 언제나 겸손과 경청이 필요하며, 퀴어 해석학이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 제공하는 학문적·신학적 논의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퀴어해석학에 대해서 입밖으로 내는 것조차 금기시된다. 왜냐하면 한국의 교회들과 교단 권력은 이를 무지와 편견 속에 ‘이단’으로 낙인찍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성서 해석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이며, 동시에 해석학적 빈곤의 자기 고백이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운가? 교회가 성서를 진정 살아 있는 말씀으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다양한 해석의 흐름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원성과 긴장을 성찰 속에서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