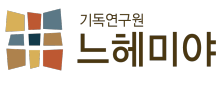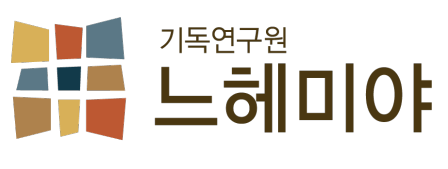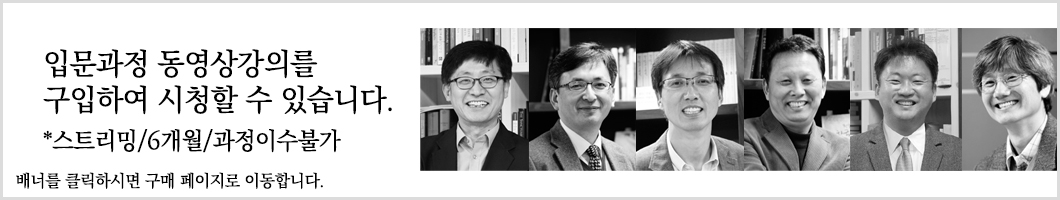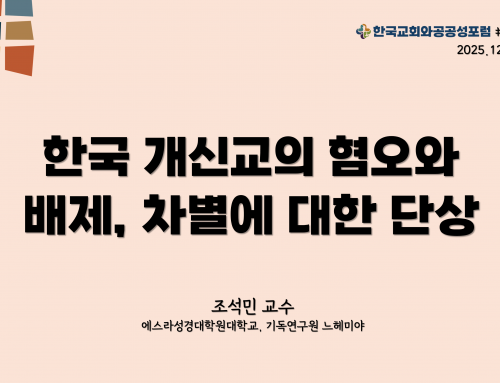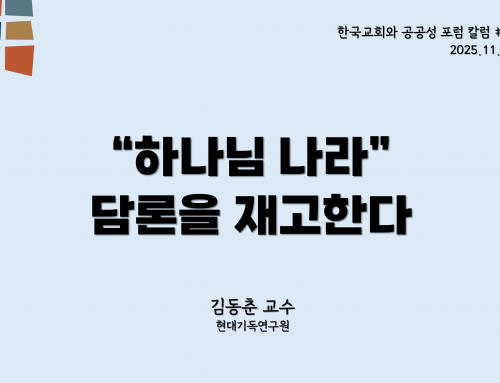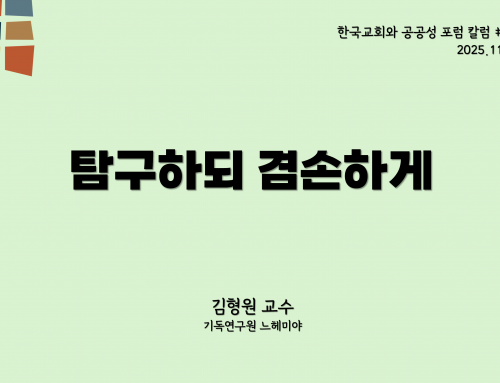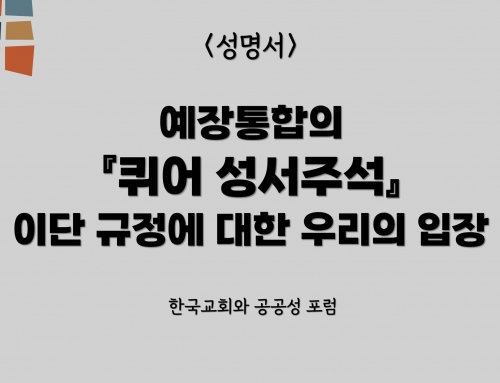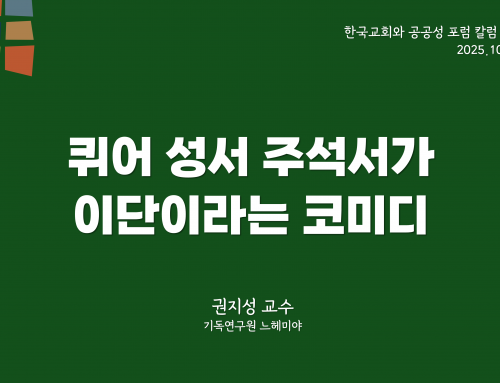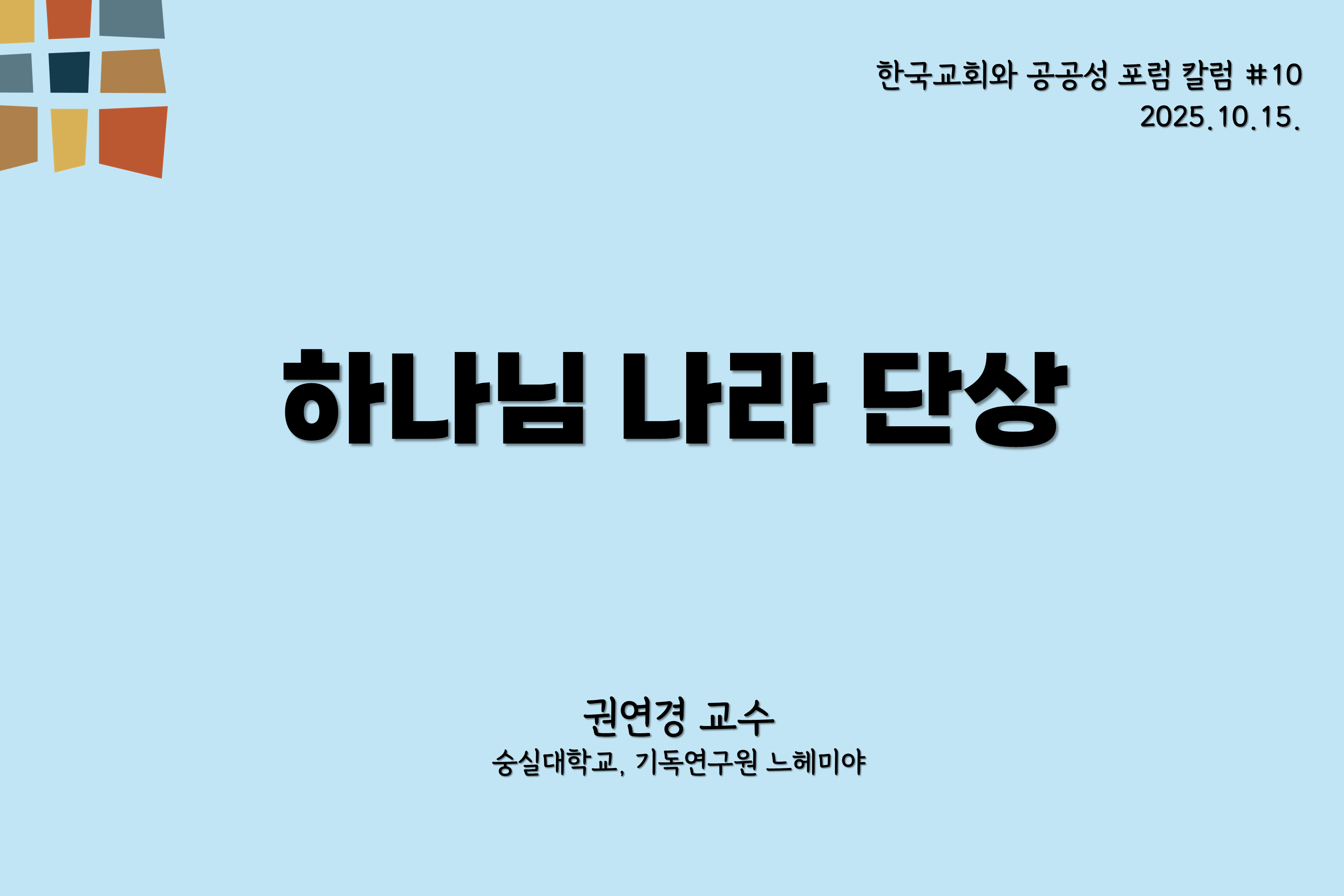
한국교회와 공공성 포럼 칼럼 #10 (2025.10.15)
하나님 나라 단상
권연경 교수(숭실대학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신약학)
‘하나님 나라’에 꽂힌 사람이 많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부분 현재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신자들의 일상적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대체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다. 생각해 보면, 다분히 역설적이다. 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압도적으로 많은 구절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이런 통계는 쉽사리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에서 요긴하게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대체로 이미 도래하여 현재 존재하는 나라다. 현저히 미래의 색채가 강렬한 성경의 초상과 달리, 주로 우리의 현재를 해명하는 신학적 장치로 하나님 나라가 소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이라 해도, 장차 올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엮는 방정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점진적 완성의 도식이 나온다. 지금 부분적으로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장차 (예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발상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오는’ 무언가에서 부분에서 전체를 향해, 혹은 미완성에서 완성을 향해 ‘발전, 성장’을 겪는 하나의 긴 과정으로 이해된다. 실제 신약성서의 종말론을 논하는 학자들의 글에는 ‘최종적인 완성’ 내지 ‘완전한 성취’ 등의 용어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도식은 사실상 이것뿐이기 때문이다. 막상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적 완성에 관한 명시적 가르침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도 별로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관심을 쏟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을 해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구원을 현재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가르쳐 왔다. 믿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과 시간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은, 어느 유명한 목사의 설교집 제목처럼, ‘구원 그 이후’로 규정된다. 한편으로는 멋진 상황인 것도 같지만, 다른 한편 당혹스럽기도 하다. 사실 우리 믿음의 최종 종착지가 ‘구원’인데(벧전 1:9), 그 목적지에 이미 도달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바라던 목표를 이미 이룬 ‘구원 그 이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차표를 손에 쥐고 기차를 기다리듯이, 하릴없이 서성이며 시간만 보내면 되는 것일까? 물론 그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삶이 목적이 없을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미 구원의 정점을 찍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목적이 남아있을까?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이 유행병처럼 휩쓸던 시절이 있었다.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 내용인데, 제목이 주는 매력이 그런 유행의 주요 동기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처럼 현재 삶의 의미를 말하기 어려운 우리들에게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공허함을 메꾸고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멋진 신학적 장치를 제공한다. 아직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간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확장하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간다. 부분적으로 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그 완성을 위해 땀 흘리는 삶,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매우 당연해 보이는 발상이다. 이런 생각에 가슴이 벅차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는 애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망각한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그 초점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나라라는 사실에 놓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여지가 전혀 없었을 때부터 이미 ‘준비된’ 상태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니 ‘그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마련해 두신 그 나라를 ‘상속한다’(마 25:34). ‘나라’를 ‘도시’로 변용하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도시’(city of God)는 세속 도시와 달리 ‘기초가 있는’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하고 건설하신 도시’를 가리킨다(히 11:18). 신실한 이들을 위해 하늘에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히 11:16). 그래서 아직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장차 올’ 그런 도시다(히 13:14). 그래서 신약성서 어디에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기여한다는 발상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 혹은 선물처럼 이 나라를 ‘받거나’ 이를 ‘상속한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일 뿐, 그 나라의 설계자도 건설자도 아니다. 이런 사실을 곰곰이 숙고하면,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 같은 표현은 거의 불경에 가까운 잘못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역설적 상황은 우리가 구원이 소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과 관계가 깊다. 신약성서에서 그리스도인은 ‘구원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혹은 부활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이 구원은 ‘의의 소망’(갈 5:5), ‘하나님 나라 상속’(갈 5:21), 혹은 ‘영생 수확’(갈 6:8) 등의 용어로 표현된다. 바울이 일인칭 고백으로 멋지게 그려내는 것처럼, 신자들의 오늘은 ‘이미’를 곱씹는 대신, 오히려 구원 혹은 부활이라는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시간이다(빌 3:12-15). 이런 미래적 전망을 잃으면 현재의 의미도 사라진다. 이런 망각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온갖 혼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혼란을 치유하는 몸짓의 하나는 희미해진 미래의 의미와 그 소망을 다시 선명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소망의 빛이 환해질수록 우리 오늘의 의미도 더 뚜렷해질 것이다.